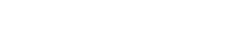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목멱칼럼]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회복에 도움 안 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서울대 명예교수]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2017년 기준으로 정신장애인 가구 월평균 가구 소득은 180만4000원으로 국민 전체 가구 소득인 361만7000원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는 장애인 전체 월평균 소득인 242만 1000원보다 60만 원정도 더 적은 것으로 전체 장애 유형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
그리고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민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42만7370명으로, 전체 의료보장인구의 0.82% 수준으로까지 증가했다. 이를 증상별로 살펴보면, 조현병ㆍ분열형 및 망상장애가 전체의 5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양극성 정동장애 24.3%, 재발성 우울 장애 22.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기간은 2018년 현재 176.4일로서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7개국 평균인 30.6일의 6배나 되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비자의적 입원 비율 32.1%,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하는 비율도 27.4%로 OECD 평균보다 모두 높았다.
정신장애인 입원 기간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선진국이 1980년대까지는 한국보다 높은 입원 병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꾸준히 줄여 온 반면에,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약 3만 병상에서 이후 약 8만 병상으로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선진국의 정신건강정책과는 상반된 것으로서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복지정책은 ‘지역사회에서의 회복’보다는 ‘격리·수용’을 중심으로 설계” 됐음을 밝혔다. 그리고 향후 정신장애인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병원과 시설 중심의 치료·서비스를 탈시설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중심 정신 의료 체계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이러한 우리나라 장기입원의 문제는 이미 2014년에 OECD 국가의 정신건강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신건강의 특성으로 자살률의 증가와 정신과 입원 병상의 증가라는 두 가지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과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물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기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을까?
첫째,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병원 및 시설 중심의 치료·서비스 목적을 탈병원화, 탈시설화 패러다임으로 대폭 전환하여 지역사회중심 정신건강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두어야 한다. 둘째, 입원치료를 급성기 병실, 응급입원, 낮 병원, 재활병실 등으로 세분화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시설들과의 연결이 유기적으로 구축돼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속한 입원, 효과적인 집중치료, 공개된 퇴원계획 등에 대한 제도장치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생애 첫 정신과 입원이 단기입원이고, 인권존중 방향으로 진행될 때, 분명 장기입원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임상경험을 토대로 생애 첫 정신과 입원에 대한 지정병원, 재원일 수, 치료프로그램 내용, 지역사회자원 활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퇴원 후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의 관심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진다”라는 뢰머(Roemer)의 법칙을 깨뜨려 정신장애인의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