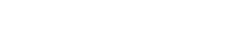정신병원이 사라진 이탈리아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하나, 우리 가족이나 주변에 자해나 타해 가능성이 있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19나 경찰을 부를까, 아니면 가장 편하고 빠른 응급환자이송센터(129)에 연락할까. 어느 쪽도 최선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 어느 것이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대개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이고,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쉽게 퇴원하기 힘들 것이다. 위 질문은 정신보건 시스템과 밀접한 문제이다.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정신병원을 완전히 추방시킨 이탈리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탈리아, 특히 내가 방문했던 트리에스테 지역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발견되면 누구나 지역 정신보건센터로 연락한다. 정신보건센터에는 24시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환자와 상담한다. 그리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동행을 설득한다. 그렇게 정신보건센터에 입소한 환자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 입원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잠시 머무를 뿐이다.
만일 환자가 입원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강제입원 절차를 거치는데, 의사 2명의 진단과 경찰의 간단한 조사, 그리고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정신보건센터에 입소한다. 강제 입원한 경우라도 한번 입원에 7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퇴원하더라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치료를 약속받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 상담사 등이 직접 환자를 방문해 상담하고 진료한다. 그런 체계 속에서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일단 치료가 시작되면 꾸준한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놀랍게도 최근 2년간 강제 입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럼 이탈리아는 어떻게 이런 체계를 갖추게 되었을까? 여기엔 1971년 트리에스테 지역의 정신보건 책임자로 부임한 프랑코 바살리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인구 약 25만명의 트리에스테에서만 1182 명의 환자가 입원 중이었고, 90% 이상이 강제 입원한 상황이었다. 부임 초기부터 병원 내부공간의 재구성, 직원과 환자의 위계구조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바살리아는 직원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나 대형 병원의 해체, 성별 분리수용 폐지, 정규적인 파티, 바(Bar) 시설 신축, 환자신문 발행, 자유로운 입・출소, 소규모 주거시설 신축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이 과정을 거쳐 1971년 1200명에 이르던 입원 환자가 1977년 초엔 132명으로 줄었으며, 그 중 51명만이 강제 입원이었다. 자신감을 얻은 바살리아는 1976년 말 정신병원 폐쇄를 공식 선언했고,이탈리아 의회는 1978년 3월 13일 정신병원의 점진적 폐쇄와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대치를 골자로한 이른바 ‘바살리아 법’을 통과시켰다. 트리에스 테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정신보건 개혁이 전국적 지지를 획득한 것이다. 마침내 1996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정신병원이 완전히 폐쇄됐다.
인구 약 25만명의 트리에스테 지역 주민 중 전화상담을 포함해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해본 사람은 약 70%에 이른다. 그렇다고 이들 모두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다. 트리에스테 보건국 부국장은 질환자를 상담하는 것만큼이나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물론 이 모든 성과를 바살리아 혼자 이룬 건 아니다. 과정이 순탄했던 것도 아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에 사로잡힌 주민들과 직원, 전문가 집단의 반발 등은 아마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트리에스테에서 면담한 모든 사람들은 폐쇄 수용형 정신병원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 나은 정신보건 서비스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 머릿속엔 여전히 비용 문제가 떠나질 않았고 그 질문은 지금까지도 따라다니고 있다. 이탈리아 보건국 관계자도 정신병원이 존재할 때에 비해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은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전에는 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만 돈을 썼지만,지금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지출하는 것이니 더좋지 않냐”고 반문했다.
반면 트리에스테 관계자는 오히려 비용이 줄어들 거라고 했다. 초기엔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교육, 시설 신축 등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으나, 트리에스테의 경우 종사자 수가 절반 가까이 줄고 환자들의 생산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점까지 감안하면 훨씬 이익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 관계자는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진나라가 비용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역시 비용이 아니라 인권인 셈이다.
★ 이 글은 최준석 님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3팀에서 근무할 때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발행 웹진 [인권] 2008 3*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