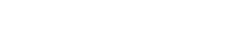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이 필요한 이유
페이지 정보

본문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이 필요한 이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7. 10. 10.)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42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정신장애인은 더 행복해졌을까? 과거나 현재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단순하다.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정신장애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V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 듣는 유일한 시간은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가 이슈였다가 순식간에 정신장애인 혐오로 전환되었으며, 2017년 3월 인천 여고생 사건은 ‘조현병’을 실시간 검색어 1위로 만들어 버렸다. 뉴스를 접한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해 버리고, 이들에게 약물을 주고, 전기치료를 하고, 강제입원을 하고 그 외 뭐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이것은 문제의 중심을 개인에 두고, 개인의 치료로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접근하려 하는 의료적 관점이다. 필자 주변의 어떤 정신장애인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그 또한 광기 어린 목소리로 치부되어 왜곡될까 걱정된다고 체념하며 읊조리기도 했다.
더욱 암울한 것은 두 사건 모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팩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1년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장애인 범죄율의 10분의 1로,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약 1.2퍼센트인데 반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08퍼센트였다. 즉 비장애인의 범죄율이 정신장애인에 비해 15배 가까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이 위험하지 않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어도 대중은 외면한다. 특정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며, 이는 ‘탈진실'(post-truth)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더 이상 팩트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좌절하고 포기해야 하는가? 아직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 2014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단체가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정당하게 표를 끊고 탑승을 시도한 운동이 있었다. 잠시만 생각해 보자. 언제 한번 고속버스를 이용하면서 이 또한 장애인이 이용해야 하는 당연한 (혹은 자연스러운)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도 비장애인은 평생 ‘모르고’ 살 가능성이 높다. 고속버스 이용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동권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억압된 집단의 정치적 행동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바꿔 주며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당사자운동의 힘이다.
2016년 5월 강남역 살인사건(왼쪽)과 2017년 3월 인천 여고생 사건은 정신장애인을 위험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진 출처 = SBS뉴스와 YTN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은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문제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정신장애인이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신장애인이 되었기 때문에 억압과 낙인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이 실현되기에는 여전히 큰 도전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흔히 ‘어떤 미친놈이 자기가 미쳤다고 인정하겠는가?’라는 말을 쓰곤 한다. 부정적 의미가 담긴 문장이지만, 이는 현실에서 정신장애인의 발언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정신장애인의 권리 배제는 정신보건서비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강제입원의 경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은 배제되고, 보호의무자에게 결정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지역사회 내 삶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물론 이는 보호자와 전문가가 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줄 것이라는 ‘선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 ‘선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변화를 위한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현재 억압되고 배제된 당사자의 권리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첫걸음은 정체성의 재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체성(identity)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규명하는 것이다. 외국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주입한 정체성을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의료 패러다임은 ‘환자’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며, 이는 정신장애인을 수동적 위치에 머무르게 한다. 정체성을 정의하는 용어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의 과정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정체성으로 북미 지역에서는, “c/s/x”(consumer소비자/survivor생존자/ex-patient이전환자)를 주로 사용하며, 영국은 ‘정신과 생존자'(psychiatric survivor) 혹은 ‘서비스 이용자'(service user)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환자’라는 용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정체성에 정답은 없다. 다만 억압된 집단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배제의 틀을 깨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을 문제의 초점으로 두는 의료적 관점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를 깨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자조직이 중심이 되는 정치운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사회학자 존 맥나이트는 “문제로서 정의된 사람들이 그 문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혁명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은 결국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헤게모니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며, 대중적 편견과 낙인과 같은 환경적 요소를 바꾸기 위한 정치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회복(recovery)은 무엇인가? 정신과 약물을 잘 복용해서 증상이 나아지면 그것이 회복일까?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왜 정신장애인의 행복은 정체되어 있는가? 약 잘 먹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정신장애인을 거부감 없이 받아 준다면 그것 자체가 회복이 아닐까? 지금까지 개인에게만 치중된 의료패러다임은 사회변혁을 끌어내지 못했다. 사회가 계속 정신장애인을 밀어내면 결국 회복은 없다. 동시에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또한 회복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송승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현장에 있다가, 지금은 한국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비당사자 활동가로 당사자운동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주체적 운동세력으로 확장되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