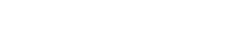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르포] 진주 방화·살인 한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자책하며 잠 설친다
페이지 정보

본문
현장에서 심층 인터뷰한 주민 11명 가운데 5명 수면제 복용
전문가 “주민들 죄책감, 무력감, 국가 기관에 분노 호소”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말해야”
전문가 “주민들 죄책감, 무력감, 국가 기관에 분노 호소”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말해야”

지난달 17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 303동 4층 복도. 피의자 안아무개(42)씨의 집은 아직 검게 그을려 있다.
아파트 208호에는 초인종이 사라졌다. 그날 누군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렀는지 피 묻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조심스레 입을 연 208호 주민 임선주(가명·48)씨가 말했다. 경찰은 “누구 손자국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아예 초인종을 떼어갔다. 임씨는 “이곳에 9년 살면서 대학생 큰 아이와 중학생 작은 아이를 키웠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는 것조차 싫고, 누군가를 일대일로 마주치면 깜짝깜짝 놀란다”며 “다음 달에 이사 가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진주에서 방화·살인으로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는 17일이면 한달이 된다. 지난 한달 동안 세상이 사건을 말하는 키워드는 ‘조현병’이었지만, 현장에서 만난 아파트 주민들은 피의자 안아무개(42)씨의 조현병보다 이웃들이 스러져갈 때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과 이웃을 지켜주지 않은 국가 기관에 책임을 묻고 있었다.
서지혜(가명·44)씨는 27일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 매일 수면제와 신경안정제 등 10종류의 약을 먹는다. 시도 때도 없이 한숨이 나오고 온몸이 자꾸 떨린다. 서씨는 며칠 전 병원 복도에 빨간색 보자기가 뭉쳐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링거 주삿바늘을 꽂은 채 그 자리에서 파르르 떨며 소리를 질렀다. 남편 이동우(가명·45)씨는 27일째 승용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무릎 담요와 점퍼 등을 덮고 잠을 청한다. 새벽에 벌떡벌떡 놀라서 깨는 일이 잦다. 낮에는 자기도 모르게 멍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 지난주엔 일용직 작업 현장에서 일하다 에이(A)자형 사다리에서 굴러떨어졌다. 왼쪽 손목뼈에 금이 갔다고 했다.
지난달 17일 새벽 4시께, 부부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뒤 베란다에서 연기를 보고 집에서 탈출했다. 나오자마자 아파트 같은 층 문을 두드리며 “불이야” 외쳤다. 유일한 탈출구인 아파트 중앙 통로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3층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안씨를 마주했다. 옆에는 젊은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이씨는 여성을 지혈하면서 동시에 우르르 내려오는 주민들에게 옥상으로 피신하라고 소리쳤다. 지옥같은 현장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부부는 그러나, 그날 이전의 삶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서씨는 직장마저 잃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빚이 많아 개인회생 신청까지 해둔 상태여서 이씨만 겨우 일을 한다. “그날 이후에 잘 때마다 꿈을 꿔요. 그 사건으로 죽은 이웃집 언니들이나 돌아가신 아버지가 등장해요. 놀라서 깨면 수면제를 달라 카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그때마다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된다꼬 한숨을 쉽니다.” 병원 침상에 앉은 서씨가 말했다.

303동 주민 천아무개(75)씨는 사건 이후 한달이 다 된 지금도 여전히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고 했다. 천씨는 사건 이후 매일 한알씩 먹은 수면제를 최근 아들의 만류로 반알로 줄였다.
천씨도 최근 자꾸 이상한 꿈을 꾸면서 잠을 설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자다가 누가 ‘엄마!’라꼬 부르는 소리가 나가 퍼뜩 일어났거든? 옆방에 가보니 우리 아들은 쿨쿨 자고 있던데, 알고 보이 그날이 죽은 주민 화장한 날이라 카더라. 내가 밥도 못 먹고 링거 맞고 그라니까 아들이 곰탕을 사 왔거든? 그런데 파를 넣어 먹어야 하는 거를 내가 고춧가루를 부은 기라. 이래 정신이 없이 산다, 내가.”
서씨 부부와 천씨만 그런 게 아니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아파트에서 <한겨레>의 심층 인터뷰에 응한 주민 11명 가운데 5명은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현장 이동 통합 심리상담센터’를 차려놓고 아파트 주민들의 트라우마를 상담하고 있는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3주 사이에 주민 80여명이 상담을 받았다”며 “사건을 목격한 7살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상담하러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남 진주의 한 국민임대아파트에 지난 10일 ‘피해 입주민 지원 성금 모금’ 현수막이 걸려 있다.
주민들의 죄책감은 평소 돈독하던 이웃 사이에서 기인했다. 취약 계층인 이곳 주민들은 13년 동안 복도식 아파트의 유일한 중간 통로로 오가며 서로 인사를 나눴고, 이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병을 앓는지 챙기며 지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이웃을 아들딸 삼아 서로 다독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유일한 통로에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5명이 목숨을 잃고, 모든 주민에게 참혹한 현장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사건 이후에도 주민들은 계속 통로로 사건 현장을 오가며 그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어제까지 인사하고 대화하며 잘 지내던 사람들인데, 랜덤으로 (살해당했는데) 순서에 제가 해당이 안 됐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주민 곽아무개(48)씨는 현장에 온 국립부곡병원 안심버스와 ‘현장 이동 통합 심리상담센터’에서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조아무개(63)씨도 깊은 죄책감에 여러 차례 상담을 받았다. “끔찍한 현장을 봤지요. 살기도 힘들고 각박한 시대를 같이 살아왔는데… 숨진 사람들은 같이 인사하고 지냈던 아는 사람들이어서 죄책감이 커요.”
주민들은 아울러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국가 기관에 대한 분노도 털어놨다. 올해 들어 안씨의 이상 행동에 대한 경찰 신고가 일곱 차례나 있었는데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였다. 곽씨는 “우리까지 알 필요는 없어도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다”며 “만약 조현병이라는 걸 알았다면 경찰도 처음부터 다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309동 주민 신아무개(51)씨는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을 신상 공개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국가 기관은 인권 침해 안 하는 범위 안에서 환자들을 주의 대상자로 두고 약은 먹었는지, 치료는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미리 대처하지 않은 국가 기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경찰을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주민도 있었다.

지난 9일 밤 아파트 303동 중앙 통로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트라우마가 심화하고 공동체가 와해하면서 주민들은 아파트를 떠나고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한달 평균 전체 9개 동에서 6세대 정도 이사를 하는데, 사건 이후 303동에서만 5세대가 이사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사비 지원만으로는 이주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주민들은 여기저기 “방랑자” 신세로 지내기도 한다. 사건 직후 아파트 주민 35명의 심리 상담을 진행한 국립부곡병원 이영렬 원장은 “주민들은 ‘내가 구할 수는 없었을까’라고 말하며 죄책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 그 감정은 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경찰과 소방, 보건복지부 등 국가 기관이 느껴야 할 것들이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라며 “이 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타해 위험이 명백한 정신질환자가 왜 치료를 중단했을까, 그의 병력이나 범죄 전력을 경찰은 왜 이전에 조회하지 못했을까, 이를 막은 법이나 제도가 문제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진주/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824.html#csidx7462b1445f4317ebaff2a3a3a2f7b2a

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