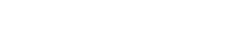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정신보건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은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다학제, 동료지원”
페이지 정보

본문
“정신보건 패러다임 전환의 원칙은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다학제, 동료지원”
미디어로 학습되는 정신장애인 범죄의 통계 정확히 알아야
정신장애인은 가해자라기보다 피해자가 될 확률 높아
전문가 중심의 통제와 관리, 열악한 정신보건 의료의 피해자
정신장애에서 사회심리적장애로 명칭 바꿔야
탈원화는 항정신병 약물의 보편화 이전에 이미 진행
반정신의학은 정신과적 개입을 사회통제로 규정
‘매드 프라이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억압의 고발
회복패러다임은 증상이 있어도 회복은 일어난다는 가치
대안적 정신건강정책 제안을 위한 ‘전국 동료지원활동 리더 워크숍’이 1일과 2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은 강제입원과 장기입원 등 정신의료적 강요로 인해 인권이 유린되는 트라우마를 겪는다”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장벽 등 막대한 인생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들의 정치적 해방운동에 뛰어든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가들은 역으로 일부 정신장애인들에게 비난을 받는다고 그는 토로했다.
이 대표는 “언론의 대중선동에 대항해 저항하는 소수 당사자운동가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처한다”며 “이는 당사자 운동가들에게 이래라저래라 지도질하는 당사자들까지 있어 당사자 운동가들은 고독과 집단폭력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신장애인들이 과연 미디어를 통해 학습되는 위험한 존재들인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c)마인드포스트.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c)마인드포스트.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폭행 등 강력범죄율은 인구 10만 명 당 비정신장애인이 68.2명이었지만 정신장애인은 33.7명이었다.
이 대표는 “누가 누구에게 위험성을 논하는가”라며 “마음 여리고 약해서 범죄와 가장 거리가 먼 집단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은 흉악범죄”라고 말했다.
2017년에 발생한 강력범죄는 총 2만7849건이었다. 이중 남성의 범죄 건수는 2만7849명(96.3%), 여성은 1078명(3.7%)였다. 같은 해 정신장애인의 강력범죄 건수는 남성 731건(2.5%), 여성 82명(0.3%)였다.
이 대표는 “모든 정신질환자는 폭력 범죄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며 “정신이상 이퀄 조현병은 성립하지 않으며 범죄의 피해자인 정신질환자는 격리와 관리가 아니라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 강조했다.
정신장애인의 자살률 등 사망자 수는 일반 비정신장애인들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전체인구의 경우 25.6명이었다. 반면 정신장애인은 207.6명으로 비정신장애인의 8.1배에 해당했다. 정신장애인의 조사망률과 평균 사망 나이도 일반 비정신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수치를 보였다.
이 대표는 “정신장애인의 조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1613명으로 전체인구 조사망률 549명 보다 3배 높다”며 “정신장애인의 평균 사망 나이는 59.3세로 전체 장애인 평균 사망 나이 74.2세보다 14.9세 적다”고 밝혔다. 2016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2세에 이른다.
이 대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질환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 대표는 “이는 이용자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전문가 중심의 통제와 관리, 자본주의 하에서 정신보건 시스템이 가하는 기본권의 박탈에 기인한다”며 “또 인간이 살아가야 할 건강권마저 잃어가는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치료와 재활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신건강 시스템의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도 이 대표는 촉구했다.
이 대표는 “패러다임 전환의 3대 원칙은 자기결정권의 존중, 지역사회 기반 다학제적 서비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의 동료지원의 전면화”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신장애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 주거, 일자리가 영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또 “정신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사회심리적장애인으로 바꿔 부정적 낙인을 걷어내야 한다”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사회심리적장애(Psychosocial Disability)가 공식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신병원도 정신건강휴양센터, 정신건강 위기쉼터로 명칭이 전환돼야 한다는 요청이다.
이어 회복의 핵심 원칙으로 “당신의 주인은 당신이다(You Own Your Own)”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사자가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것은 탐구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며 “탐구란 자이이해 과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질환이나 신경증을 앓는 주체의 자기이해 노력은 돌파력 구축의 핵심”이라며 “투병도 자기가 하는 것이고 인생도 자기가 사는 것이다. 당사자운동에서 강조되는 건 자기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약물 관리나 운동 등은 인생을 사람답게 살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대표는 “투병이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성의 맥락에서 자기를 찾는 길”이라며 “이는 자신을 사랑하는 차원보다 더 나아가는 차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한국사회의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하지만 없는 부분들을 분석했다. 즉 아플 자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치료받을 권리, 위험한 직면할 자유,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교육과 기회 등이 박탈돼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의 당면 과제는 어떤 것일까.
이 대표는 “당사자의 사회정치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며 고객과 이용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소비자 주권운동, 정신병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차원의 정책,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태도의 배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동료지원가의 교육과 양성, 동료지원가의 활동, 리얼 페이(real pay), 리얼 잡(real job)이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인생이건 가까이서 보면 정상은 없다”며 “투병의 소중한 자산이 깨달음에 이를 때 당사자는 인생의 지평선을 만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에 있는 송승연 활동가는 해외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운동과 서구의 회복 패러다임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근대 정신의학은 정신장애를 도덕적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를 위해서는 수용을 통해 계몽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송승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 활동가 (c)마인드포스트.
송승연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 활동가 (c)마인드포스트.
프랑스, 영국에서의 근대 정신의학은 일반 의학처럼 정신장애를 ‘고장’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교육하고, 계몽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도덕관을 심어주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지만 교육이 되지 않을 경우는?
송 활동가는 “교육을 통해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입원을 수감으로, 교육은 교정으로, 치료는 처벌로 변형되어 간다”고 분석했다. 수용소의 폭발적 증가는 정신장애에 대한 지배적 의학담론과 맥을 같이 하게 된다.
1800년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수용소가 몇 개에 불과했고 수용인원도 수백 명에 그쳤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미국은 수용소에 15만 명이 수용됐고 프랑스 파리는 수용소 108개, 영국은 2000 병상이 넘는 수용소가 여러 개 증설된다. ‘수용소의 세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당사자 운동의 역사도 함께 진행된다.
20세기 들어 정신장애인들과 활동가들은 정신병원에서의 장기간 강제수용과 비자발적 치료에 대해 반발했다. 시대적으로 탈원화도 함께 진행됐고 정신의학에 대한 전면적 비판도 제기됐다. 그렇다면 20세기 중반 항정신약물의 개발과 보편적 사용이 탈원화를 이끈 추동력이었을까.
송 활동가에 따르면 ‘광기와 문명’의 저자 앤드류 스컬은 1950년대 항정신병 약물이 보편화되기 이전부터 정신병상이 감소하는 탈원화가 진행됐다고 분석한다. 약물 사용의 확대 경로와 정신병상의 감소 경로는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
송 활동가는 “실제 정신병상의 감소는 복지 서비스의 발전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며 “미국에서 1960년대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은 그 시기에 노인의료보호서비스 제도와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보충적 급여제도 구축으로 (탈원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활동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들의 세계적 운동의 획을 그었던 ‘반정신의학’ 운동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주목했다.
반정신의학은 1960년대 정신과 의사들과 심리치료사들로 이뤄진 정치적 집단을 의미한다. 이탈리아 정신보건 개혁운동가 프랑코 바살리아 정신과 의사는 ‘자유가 치료’라는 명언을 남겼고 1978년 공립 정신병원의 모든 폐쇄를 강제하는 ‘법 180호’를 공포한다.
송 활동가는 “반정신의학은 정신과적 개입이 계급·인종·젠더·섹슈얼리티 등과 관련돼 사회적 통제의 역할을 한다고 규정했다”며 “1973년 미 정신의학회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리스트(DSM)에서 삭제하면서 동성애자들은 질환에서 벗어나 ‘순식간에’ 치료가 됐다”고 말했다.
반정신의학과 맥을 같이해 정신장애인 당사자운동이 세계적으로 속속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1960년대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과 반전운동, 학생운동의 영향으로부터 출발했다.
송 활동가는 “이러한 운동의 토대 위에서 1970년대 정신장애인에 의한 광범위한 당사자 운동의 시대가 열렸다”며 “당사자운동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강제적이고 해로운 치료에 저항하기 위해 행동했으며 자기옹호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장애인 당사자 집단은 자신들이 꼬리표를 달고 다니면서 경험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해 지적했다”며 “그들은 꼬리표가 사회적 기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1972년 미국 오클랜드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정치적 해방과 맥을 같이 하는 MNN(Madness Network News)이라는 잡지가 발간됐다. 이 잡지는 대안적 치료법을 모색하고 약물 치료와 같은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주장을 모으는 토론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당사자들의 정치적 운동도 활발해졌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오리건 주 포틀랜드에서 ‘광기해방전선’이 꾸려진다. 또 1971년 뉴욕에서는 ‘정신과 환자 해방 프로젝트’, 캘리포니아와 보스턴에서도 이 무렵 당사자 집단들이 형성된다. 캐나다에서는 1972년 정신과환자협회가 설립됐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1990년에 이미 100개의 당사자단체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크숍 참가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워크숍 참가자들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c)마인드포스트.
정신장애인 소수자 운동의 핵심 철학도 등장했다. 1993년 최초로 시작된 퍼레이드인 ‘매드 프라이드(Mad Pride)’는 정신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폭력을 고발하고 자신들의 경험에서 가치 있는 것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다.
송 활동가는 1980년대에 탄생한 회복 패러다임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미국와 유럽은 국가의 정신보건서비스 시스템 내에서는 정신의학이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병리적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정신장애인들의 회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됐다. 이후 정신장애를 들여다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된다.
송 활동가는 “전문가라는 타자의 관점에서 개입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학술지에 자신의 경험이 담긴 글을 기고하고 책을 출간하기 시작했다”며 “이때부터 정신보건 체계 내에서 정신장애로부터의 회복(recovery)을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복 패러다임의 근본적 관점은 증상이 존재하는 가운데에도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것”이라며 “회복 과정은 개인마다 고유한 과정이며 핵심은 과거에 무가치한 존재로 남아 있던 자신을 자각함으로써 자신을 재정립해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가 주최했다.
출처 : 마인드포스트 (http://www.mind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fbclid=IwAR0V9a2cyF8ZpVOmmzAAlwYGrGxM9D4v48-SK-uFU2Tja92SvRTo5N2CfVc)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