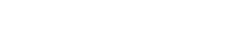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정신장애인 약물, 이대로 괜찮나 ①] "약물만이 유일한 대안?"
페이지 정보

본문
'마인드포스트'는 도파민을 증상의 원인으로 인식하는 정신의학의 도파민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지지를 통한 비약물치료로 증상의 고통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이용표ㆍ정유석ㆍ배진영ㆍ송승연, 정신장애인의 항정신병약물 복용 경험에 대한 연구: 하이데거의 기술 비판을 중심으로'(한국장애인복지학, 2019)를 재구성해 연재기사로 싣는다.
(c) ScienceNordic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투입된 약물은 감각을 둔화시키거나 신체적 고통만 유발하는 게 아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둘러싼 의료적 신념은 당사자를 통제하는 데 기여한다. 의료진은 치료를 위해서라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당사자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약물만이 능사라는 신화를 창출한다. 이러한 정신병원의 전략은 당사자의 가족에게도 전염된다. 당사자 가족 구성원들은 '약물관리'라는 이름으로 의료진을 대신해 당사자의 '약물 감시자' 역할을 자처한다.
당사자 A씨는 다른 당사자 동료와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주치의는 동의하지 않았다. "의사들은 약을 되게 맹목적으로 약, 오로지 약만인 것 같아요. 내가 만났던 의사들, 약이 제일 중요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이렇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요." 의료진의 이러한 태도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억압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원인이 됐다.
당사자 B씨는 1주일에 1회 회진을 통해 환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이 약물만 처방하고 떠나버리는 의사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회진을 와요. 딱 앉으셔가지고 세 명 앉혀놓고 (...) '쟤는 리튬을 얼마 올려, 쟤는 리튬을', 그 얘기만 해요." 당사자들이 경험한 이러한 진료는 단순 약물처방에 다를 바 없다. 심지어 이러한 진료는 날카로운 무기로 변화해 당사자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의료진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약물 처치 대상'으로 간주했다. 당사자 C씨는 악몽에 시달리는 경험과 관련해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악몽을 완화하는 약물의 추가 처방이었다. 약물 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당사자는 생활 속 고민이나 어려움을 의료진에게 허심탄회하게 말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상한 꿈을 많이 꿔가지고, 주치의한테 이제, (...) 그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 그러면 약물을 높여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힘든 것을 이야기하면 또 무슨 약이 늘어나고 , (...) 또 '무슨 증상이 생긴 것 같아요. (...) 무슨 약을 써줄게요.' 또 부작용이 늘어날 거를 생각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그냥 요 정도 불편하고 요 정도만 먹자."
약물만이 능사라는 의료진의 신념은 다양한 의료행위와 관행으로 이어졌다. 입원 중 일괄적으로 환자들에게 약물을 복용하라고 한 뒤에 입 속을 확인하는 것은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관행이다. 이러한 강요에 순응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체를 강압해서라도 반드시 약물복용이 이뤄져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약물 불이행(medication non-adherence)'이 재발의 원인이고 당사자의 '병식(insight)'이 낮을수록 약물 불이행의 위험이 높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사자 D씨는 이렇게 말했다. "조금 반발을 하거나, 의료진에 반하는 말을 하면 강박을 해버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요. 강제로 먹게 하고. 그래도 나는 안 먹겠다 하면, 강박돼요, 사실은."
(c) Alamy
가족 구성원에게 전염되는 약물 복용 감시
약물을 강요하는 의료진의 역할은 당사자가 퇴원하고 가정으로 돌아올 때 가족 구성원에게로 전염된다. 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가족에게 물어도 가족은 제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 당사자 A씨는 약물 복용을 감시당하는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항상 (약물을) 오픈된 장소에 놓길 바라고, 보이는 곳에 약을 두고 먹길 바라는 것 같아요. 항상 식탁에 약봉지가, 약이 개봉된 채로 놓여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는 걸 부모님이 볼 수 있는 거죠."
가족 구성원은 약물 때문에 당사자에게 벌어지는 의도치 않은 작용들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약물 복용을 강요했다. 당사자 E씨는 약물 부작용에 관한 가족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다. "(부모님이) 많이 간섭을 하셨죠. 저도 그거에 대해 반감이 있었고 그랬는데요. (...) (부모님은) 약은 처방해주는 대로 먹으면 된다고 이해하고 계시고,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셨죠. 그냥 그런 줄만 알고 계셨고."
당사자들이 퇴원하기 위해 면회 온 가족에게 약을 잘 먹겠다는 조건을 내거는 사례는 부지기수다. 심지어 당사자 F씨는 약을 먹지 않으면 강제입원을 시키겠다는 가족의 협박을 받았다. "잔소리를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거나 그러면 '너 또 이상하네! 약먹으라'고 그러고. 감시하다가 약 먹어도, '안 그러면 강제입원시켜버릴 거야!' 협박하고."
약을 복용해야 인정하는 사회
당사자가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약물 복용으로 입증된다.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사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례도 있다. 어떤 주거시설은 약 먹는 것을 규칙으로 삼고 안 먹으면 쫓아내기도 한다.
당사자의 상태가 나빠질 경우 주변의 반응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느냐'의 여부다. 당사자의 상태가 어떻게 나빠지게 됐는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게 당사자 A씨의 지적이다. "내가 흥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말하면, '약 먹었어요?'(라고 묻는다)"
약물은 당사자의 정신적 현상을 견디게 하거나 증상을 버티게 해준다. 반면 끔찍한 부작용과 또 다른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경험한 정신병원 체계는 약물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작동시키는 구조로 형성돼 있다. 게다가 정신과 의료진들은 약물이라는 의학적 권력을 행사하고, 그 효과를 맹신하는 당사자 가족 구성원은 의도치 않더라도 당사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억압하는데 동참한다.
의료진과 가족에게서 약물 복용을 강요받는 당사자는 약물을 복용해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짓 신념 아래서 고통받으며 차츰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다. 약을 먹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우리사회에서 당사자가 택하는 극단적 대안 가운데 하나가 '자살'이다. 약물치료 외의 다양한 정신과적 접근과 당사자를 위한 진심어린 마음이 시급하다.
(c) Medical Daily
출처 : 마인드포스트(http://www.mindpost.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