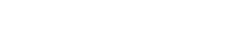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단독] “경미한 범죄 저지른 정신질환자도 치료명령 의무 부과”
페이지 정보

본문
국립공주의 치료감호소의 환경도 형편이 없고, 보호관찰이 끝난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지원도 없는 한국에서 정작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를 이롭게 할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통제하고 처벌을 손쉽게 할 것만을 논의하는 국회, 결국 강제치료를 손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강제라는 것은 후유증이 더 크게 남기 마련이다. -파도손 이정하-
정부·국회, 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 법안 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사회 내 보안처분인 치료명령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또 치료명령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정보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는 법안도 나왔다. 지난 2016년 12월 도입된 치료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투약 등을 관리해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라도 국가 치료·관리망 안에 포섭해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복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말 심신장애가 인정된 정신질환 범죄자가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치료명령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게 하는 조항을 담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태섭·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치료명령 대상 범죄의 법정형을 ‘벌금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좀 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다.
또 국회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정신질환자에게 부과되는 치료감호 종료자나 치료명령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정보를 보호관찰소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센터)와 경찰에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송 의원)돼 있다. 정신센터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재범방지·사회복귀 등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나 보호관찰 정신질환자가 자율적으로 정신센터에 등록할 수 있는 길만 열어뒀으나 등록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4월 발생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의 경우 치료감호를 받고 풀려났으나 정신센터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이에 보호관찰소가 정신센터·경찰과 모든 정신질환 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나온 배경에는 더 많은 정신질환 전과자를 국가 치료망 안에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수년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으나 이 같은 치료감호법 및 사후관리를 받는 사람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대검 범죄분석 자료를 보면 정신장애 범죄자는 2013년 6,001명에서, 2015년 7,015명, 2017년 9,089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7년 360건, 2018년 254건이었으며 올해 9월까지도 186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들이 법제화되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도 치료명령·치료감호→정신센터로 이어지는 국가의 치료·관리망 안에 놓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전과자들의 재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으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벼운 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된다”며 “국가가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 내 치료를 촘촘하게 돕는다면 향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