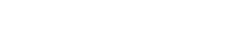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책과 삶]코로나19가 드러낸 정신장애인 인권의 민낯…“폐쇄병동에 우리가 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책과 삶]코로나19가 드러낸 정신장애인 인권의 민낯…“폐쇄병동에 우리가 있다”](http://img.khan.co.kr/news/2020/06/12/l_2020061301001386600122861.jpg)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첫번째 사망자는 폐쇄병동에 20년 동안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이었다. 60대 남성인 그는 사망 당시 몸무게가 42㎏에 불과했다. 한국 정신장애인의 실태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정신장애인을 비장애인과 격리해 ‘수용’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대체로 ‘정상’으로 여겨진다. 정신장애인을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에 해악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신장애인을 격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의 일환으로 시작됐고, 여기에 우생학이 학문적 논리를 제공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이때 생겨났다. 자연스럽게 차별과 배제가 이어졌다.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정신장애인들은 이번에는 민간이 만든 무허가 기도원과 정신요양원에 갇혔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뒤에도 정신병원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 갔을 뿐 여전히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내과의사이면서 인권의학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한국 정신장애인의 수난사와 현실을 꼼꼼히 기록해 책으로 냈다. 과거에 비해 사회적 인식도, 제도도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만명 이상의 정신장애인이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에 갇혀 살아간다. 참고로 국내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는 5만여명이다.
정신장애인은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탈리아는 40년 전에 일찌감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선언했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의 의지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다”고 외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자세다.
원문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