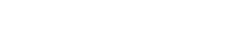30년만에 집으로 돌아간 형원씨, 엄마 목을 조르려 했다 [이슈&탐사]
페이지 정보

본문
[‘미친’ 사람들과의 인터뷰-정신질환자 장기수용 실태 추적기] <2부> 오류의 반복 ⑥ 준비 않는 사회

“환자분 상태가 좋은데 퇴원 하시는 게 어떨까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요?”
“정 안 되면 금방 다시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지막 기회를 줘 보시죠.”
주치의는 2017년 말 권형원(가명·60)씨 가족에게 그렇게 제안했다. 그녀는 24살 때 처음 정신질환이 발현돼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10년을 보냈다. 이후 경기도 A정신병원으로 옮겼는데 그곳 생활이 20년째가 되던 해, 의사는 퇴원을 권유했다.
가족이 주저한 건 그녀가 과거 잠시 퇴원했을 때 겪은 두 번의 경험 때문이었다. 병원에서는 증상이 호전돼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퇴원만 하면 증상이 올라왔다. 가족들과 상담해봤더니 그녀는 병원 밖에서는 약을 먹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가 약을 먹이려고 하면 독이라고 거부했다. 폭력성이 강해져 2주 만에 재입원하기도 했고, 그녀가 버텨서 5개월을 함께 지낸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주치의가 먼저 퇴원을 권유했을 정도니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 오랫동안 투약을 하며 병식(病識·병에 걸렸다는 자각)도 생겨난 듯 했다.

준비 안 된 탈원화의 비극
하지만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간 뒤 그녀는 다시 약을 거부했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약을 먹지 않았다. 그러다 증상이 점차 심해졌고, 가출도 잦아 종종 보호소에서 발견됐다. 투약을 관리해 줄 사회적 지지는 없었고, 아흔이 다 된 모친은 그녀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났다.
“얘가 엄마 목을 조르려고 했어요. 엄마가 밥에 이상한 약을 넣는다고 밥도 안 먹고, 약을 밖으로 내던지고, 엄마한테 더럽다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어머니의 친구가 병원에 달려가 재입원을 호소했다. 권씨와 같이 살면서 모친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무렵 초기 치매 증상까지 나타났다. 그녀가 다시 정신병동에 들어간 뒤 엄마는 요양원으로 갔다.
하마터면 어머니를 살인할 뻔했던 순간을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잔뜩 약을 먹이는데 내가 약을 안 먹었어요. 누가 나를 움직여가지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게 한 거 같아요.”
매달 누나를 찾아가는 권씨의 동생(57)은 약 관리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했다. 퇴원해 혼자 살려면 의식주가 해결돼야 하는데 권씨는 인생의 절반을 정신병동에서만 지내 혼자 밥을 할 줄도 모른다. “의식주가 될 정도로 병원에서 훈련이 됐다면 나가서 살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고, 교도소에서도 직업 훈련은 해주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보호자가 24시간 돌보지 않더라도 생활할 수 있어야 퇴원할 수 있겠죠.”
병원은 그 뒤로 권씨의 퇴원을 입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준비 안 된 ‘탈원화’로 그와 같은 환자들은 계속해서 병원으로 돌아왔다. 사회는 정신장애를 손가락질만 했고, 이들이 사회와 공존할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권씨는 인터뷰 때 “나가고 싶다. 엄마를 보살피려 면회도 가고 그래야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이런 환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을까.
슬픈 귀환
“너무나 오려있어서 퇴원함니다.”
1989년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서정건(가명·72)씨는 2017년 11월 퇴소했다. 28년 만이었다. 그는 퇴소 사유에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너무나 오래 있어서 퇴원한다’고 적었다. 초등학생이 일기장에 쓴 글씨처럼 서툴렀다.
서씨는 정신병원과 시설에 정말 오래 있었다. 첫 입원은 1980년이었다. 실연의 아픔을 겪은 뒤 마음에 병이 생겼다. 망상과 환청 증세로 어머니를 때렸고,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뒤부터는 약 관리가 이뤄지며 별 문제없이 지냈다. 하지만 일상이 없이 매일 반복되는 집단생활에 무기력이 깊어졌다. 입소 15년 뒤부터 “제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존재 의미를 생각할수록 망상도 짙어졌다.
퇴원을 본격적으로 요구한 건 2010년부터다. 그때부터 서씨는 한 달에도 수차례 퇴원 의사를 표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생각하며 지낸다”며 계획도 구체화했다. 그러나 가족은 협조하지 않았다. 1년에 한두 번 가족이 면회 올 때마다 퇴원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여기 더 있으라. 당분간 여기서 살라”는 설득이었다. 해가 지날수록 욕구는 커졌다. 서씨는 가족이 면회를 올 때면 퇴원을 하겠다며 짐을 잔뜩 싸들고 면회실에 갔다.
2017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되면서 서씨가 원하는 퇴소가 가능해졌다. 입원 요건이 강화돼 서씨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시설은 그의 퇴소 의사를 마냥 묵인할 순 없었다. 그렇게 28년 만에 바깥세상으로 나왔다.
사회는 그를 반기지 않았다. 시설 관계자들은 서씨를 보호자 집 앞에 내려줬지만 보호자는 거부했다. 서씨가 시설에 다시 가기를 원치 않았기에 결국 경찰서 앞에 내려주고 관계자들은 떠났다.
아무 준비 없이 밖을 나선 서씨의 소식이 들려온 건 퇴소 20일 만이었다. 경찰서에서 시설에 연락을 줬다. 모텔을 전전하며 돈을 다 써버린 그는 택시비를 못내 경찰서에 잡혀 있었다. 시설에 돌아온 서씨는 그러나 일주일도 안 돼 다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시설 측은 이번에는 서씨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교육도 시켜 퇴소시키기로 했다. 그는 시설 도움으로 갖고 있던 금목걸이를 팔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을 계약했다. 시설은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도 의뢰했다. 한 달간의 준비를 마친 뒤 서씨와 함께 계약한 집으로 출발했다.
시설은 서씨의 전입신고를 돕고 휴대전화도 개통해줬다. 음식을 사다두고 생활 방법도 알려줬다. 그는 수급비로 월세를 내면서 생활하게 됐다. 노인복지관에서 도시락 지원도 해줬고, 지역 복지센터에서 서씨를 방문해 사례관리도 이어갔다.

이번엔 그가 그토록 바라던 퇴소의 꿈이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1년이 채 되지 않아 증세가 다시 나타났다. 스스로 약을 먹지 않고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다보니 당뇨도 심해졌고, 정신과 증상도 나타났다. 환자의 증상을 살피고 적극 개입하는 게 지역 사례관리자의 몫이었지만, 그가 맡은 일이 너무 많았다. 1인당 60명 내외의 환자를 관리(2017년 기준)하는 인력 체계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집중사례관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서씨와 같은 신규 등록자를 신경 쓰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방치 상태에서 서씨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주민 신고가 들어올 때까지 서씨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웃 민원이 들어오자 시에서는 서씨를 관리하기보단 입원시키기를 택했다. 바깥생활 14개월 만에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됐다. 서씨는 지금까지도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다. 퇴원시켜달라는 그의 꿈은 너무 빨리 꺾이고 좌절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제도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6월 23일 시점 입원환자 6만6688명 중 행정입원 환자는 2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9월 1일 시점에는 행정입원이 입원환자 6만7749명 중 2796명까지 증가했다. 보고서는 “탈원화 과정의 지표인 ‘퇴원 후 지속관리율’이 법 개정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탈수용화를 이끌 지역사회 정신의료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4007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