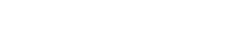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조현병 망상, 없애진 못해도 사회가 내용 바꿀 수 있어요”
페이지 정보

본문
정신과 의사 안병은 “정신질환자 입원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서 돌봐야”
미국·이탈리아 ‘탈수용화’ 현장 탐방하고 우리가 준비할 것 7가지 제시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안병은 지음/한길사·1만7000원
소년은 ‘자발적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가볍고 참을성이 없다는 뜻이다. 수업 시간에 하도 떠들어서 입술을 빨래집게로 집어두는 벌칙을 받았고, 심한 날은 담임 선생님이 “북 치는 연습을 하고 오라”며 그를 복도로 내보내기도 했다.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집중하는 일이 소년에게는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 소년이 커서 정신과 의사가 됐다. 그리고 알게 됐다. 에너지를 주체 못 해 극도로 산만하고, 실수가 유독 잦던 자신이 실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였다는 사실을. 어렵게 의사가 됐지만 진료실에서 차분히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결심했다. “생긴 대로 살아보자”고. 그렇게 진료실 밖으로 나와 ‘동네’에서 환자를 만나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펴낸 정신과 의사 안병은씨의 이야기다.
17일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만난 그는 자신을 “병원에서 반, 지역에서 반을 보내는 의사”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그는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동시에 충남 홍성에서 정신질환자와 함께 농사를 짓는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이사장으로도 활동한다. 코로나19가 터진 올해 1월까지는 비정부기구(NGO) ‘세계의 심장’ 상임이사로 매달 캄보디아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여권에 찍힌 캄보디아 입국 도장만 60개가 넘는다.

언뜻 “산만해” 보이는 안씨의 다양한 활동을 관통하는 단어는 ‘탈수용화’다. 쉽게 말해, 정신질환자를 기관(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돌보자는 것이다. “병원을 해체해서 지역사회에 ‘뿌려야’ 해요. (…) 현재 10만명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이 가운데 80%, 좁게 잡아도 50%는 병원 밖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입원은 최소한으로 하되, 일단 입원한 환자에게는 제대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정반대라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일단 입원환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입원이 ‘치료’가 아니라 ‘수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책에 인용된 통계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신보건시설 병상 수는 1984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 동안 1만4450개에서 9만7560개로 증가했다.’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만4000원)에 비해 턱없이 적은 3889원이다.’ 예산이 적은 상태에서 입원 환자만 늘어날 경우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치료법을 다 못 써먹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현실이 못 되거든요.”
그러나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거치면서 정신장애인, 특히 조현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집단적으로 학습한 사회에서 ‘탈수용화’는 사회 곳곳에 ‘폭탄’을 설치하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조현병 환자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행동파’ 의사인 지은이가 미국, 이탈리아로 떠난 이유다. 우리보다 먼저 탈수용화를 시도하고 정착시킨 나라에 가서 병원 밖에서 정말 치료가 가능한지, 오히려 지역사회에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만 키우는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탐방의 결과물이 책에 자세히 수록돼 있다. 68혁명의 열기 속에서 탈수용화가 진행된 이탈리아에서는 1978년 모든 정신병원을 폐쇄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모든 정신병원이 국가 소유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은이가 방문한 이탈리아 북동부 트리에스테 지역은 정신병원이 사라지고 4개의 정신건강센터가 들어섰는데 풍부한 인력(정신과 의사 21명, 임상심리사 8명, 간호사 123명 등)을 보유해 치료 전문성도, 시민 접근성도 높다. “정신건강센터 대부분 의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지만 비상근이라 일하는 날도 적고 출근을 해도 회의나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 바쁜” 우리와는 대조적이다. 무엇보다 다른 점은, 정신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이나 지역 사회 안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것이다. 환자를 돕기 위한 ‘지지 주거’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촘촘하게 짜여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폭력적인 환자는 격리해야 하는 게 아닐까. 지은이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물으면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옆에 머물면서 무언가를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이탈리아의 탈수용화 현장을 두루 둘러본 그는 이 책에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일곱 가지를 제시한다. 퇴원한 환자가 돌봄을 받지 못해 재입원하는 ‘회전문 현상’, 퇴원 뒤 교도소 같은 더 열악한 시설로 들어가는 ‘횡수용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센터를 내실화하고, 지역 내 주거·직업훈련 시설을 갖춰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게 그 뼈대다.
말로만 주장하는 건 역시나 ‘행동파’인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는 2007년 편의점부터 시작해 운동화 빨래방, 세탁 공장, 카페를 차려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실험을 해왔고, 2014년부터는 충남 홍성에 비닐하우스 2동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캄보디아로 의료 봉사를 갔다가, 동네를 배회하는 정신질환자를 거둬 함께 망고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15년 동안 병원에서만 지낸 환자가 농사를 지으며 마을에 정착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를 찍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는 작업도 하고 있다.
“조현병 환자가 환청을 듣고 망상을 보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환청·망상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면 그들도 당연히 우리에게 적대감을 느낄 것입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