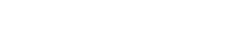탈원화, ‘정상인’을 넘어서
페이지 정보

본문
1. 비가시화 전략
“네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내가 보기엔 넌 운동을 하면 나아.”
으레 그런 말을 듣곤 하는 나는 스물다섯 살이고, 여성이며, 정신장애인이다. 대학교 재학생이고, 14살에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래 현재에 와서는 조현정동장애라는 병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폐쇄병동에 다섯 번 입원했고 수없이 많은 자살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왼팔에는 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붓질을 하듯 면도날로 그어둔 자국이 빽빽하다.
서두에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이것은 나의 자기고백 일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왼팔의 거대한 흉터를 가진, 여성인, 정신장애인으로서 겪는 수모와 지탄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 왼팔을 가려줄 팔이 긴 옷과, 종종 여성의 것으로 치환되는 섬세한 감수성과, 도무지 ‘미친년’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성격 특질과 대학생 신분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멤버십을 갖는다는 뜻이다.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주인공은 자신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결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데, 이러한 비가시화 전략이 성공하는 한에서 그는 성공적으로 사람을 연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보이고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
긴팔 옷은 나의 ‘결함’을 가려준다. 여성의 영역으로 패스되는 나의 우울감은 내 ‘진짜 우울감’을 가려준다. 나의 예의치레를 할 줄 아는 내성적인 성격과, 대학생이라는 정상적 신분은 나를 정신장애인이라는 계급적 나락 속에서 나를 건져낸다. 그 총체가 바로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나’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내가 이 정상성 규범의 밖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반팔 옷에, ‘진짜 우울감’에, 곧잘 나서는 무직자. 나는 자신이 없다.
2. 폐쇄병동과 자유
정신장애인을 폐쇄병동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어떤 정신장애인에게는 폐쇄병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도소 수감이 에세이를 펴낼 만큼 값어치 있는 황금의 경험이었듯이.
폐쇄병동은 감옥이다. 병동이 환자의 신체를 가두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폐쇄병동은 영혼을 가둔다. 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결박해 병동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때로 약을 잘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려보라고 한다.
감옥은 ‘완전하고 준엄한 태도’이다. 감옥은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기구여야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하자면 신체 훈련, 노동 능력, 일상 행동, 도덕적 태도, 적응력 등 개인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즉, 완전 규율의 체제이다. 사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교육의 힘은 대단한 것이다. “감옥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을 크게 넘어선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폐쇄병동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 그 이상이다.” 주기적으로 환자의 ‘모범적인’ 태도를 시험하고, 자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서 대신에 정해준 아름다운 도서들을 읽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짜인 프로그램을 듣고, 병원에 잘 적응하면 ‘형기’를 앞당겨준다.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다. 폐쇄병동 입원, 특히나 강제입원이란 명백히 21세기의 수치이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폐쇄병동 속에서만 일어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환자복을 입고 ‘누가 보아도 환자’라는 딱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바깥세상으로 나오면 어떠한가? 어느 누구도 거리를 활보하는 개중 누가 정신병자인지 맞추고 호언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 비가시화의 전략을 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차별을 덜 받는다. 혐오의 목소리에서 조금쯤 자유롭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자유’인가?
3. '정상인' 반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본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나는 적어도 한 번 우리가 출생 시에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존재라면, 사람대접을 받아야 그 논리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서 감옥과도 같은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모두 사회로 몰아내라. 그리하여 정신장애인이라는 사회의 ‘가시화 되지 못한’ 존재들의 부담을 모든 국민에게로 분산시켜라.
탈원화에 대해 생각한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서 벗어나는 것, “de"institutionalization탈원화다. 물론, 폐쇄병동에 갇힌 수많은 죄 없는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란 이 정상 규범 제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세상은 어찌보면 기분으로 치면 조금 널널한 병동과 같은 느낌일지도 모른다. 숨기면 가끔 장애인인 걸 모르는 체 해주고, 드러내면 아주 가끔씩은 동정이라도 해주는. 그러나 잘 ‘관리’되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모음집에 꽂히는 인생으로 마감하기엔 정신장애인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찬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자해 흉터를 드러내어도, 나의 우울이 ‘여성적 우울’이 아니어도, 내가 설사 모든 성과 계급의 이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지라도, 폐쇄병동에 입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서고 사회에서 성장하는 삶을 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탈원화의 과제는 앞으로 ‘정상인’을 넘어서는 추후의 과제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아니,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절대로 이르지 않고 적절한 시기, 바로 이 시대의 과제일지도 모른다. “탈원화는 탈시설을 넘어 정상성 제도를 이겨야 한다.”
참고문헌
김현경 저.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네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내가 보기엔 넌 운동을 하면 나아.”
으레 그런 말을 듣곤 하는 나는 스물다섯 살이고, 여성이며, 정신장애인이다. 대학교 재학생이고, 14살에 처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이래 현재에 와서는 조현정동장애라는 병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 폐쇄병동에 다섯 번 입원했고 수없이 많은 자살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왼팔에는 수를 놓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붓질을 하듯 면도날로 그어둔 자국이 빽빽하다.
서두에 스스로를 소개했지만 이것은 나의 자기고백 일기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왼팔의 거대한 흉터를 가진, 여성인, 정신장애인으로서 겪는 수모와 지탄뿐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내 왼팔을 가려줄 팔이 긴 옷과, 종종 여성의 것으로 치환되는 섬세한 감수성과, 도무지 ‘미친년’으로 보이지 않는 나의 성격 특질과 대학생 신분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 공동체 안에서 멤버십을 갖는다는 뜻이다. 사람임은 일종의 자격이며,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에서 주인공은 자신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결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는데, 이러한 비가시화 전략이 성공하는 한에서 그는 성공적으로 사람을 연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답게 보이고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
긴팔 옷은 나의 ‘결함’을 가려준다. 여성의 영역으로 패스되는 나의 우울감은 내 ‘진짜 우울감’을 가려준다. 나의 예의치레를 할 줄 아는 내성적인 성격과, 대학생이라는 정상적 신분은 나를 정신장애인이라는 계급적 나락 속에서 나를 건져낸다. 그 총체가 바로 사회적으로 존중 받는 ‘나’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내가 이 정상성 규범의 밖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 반팔 옷에, ‘진짜 우울감’에, 곧잘 나서는 무직자. 나는 자신이 없다.
2. 폐쇄병동과 자유
정신장애인을 폐쇄병동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어떤 정신장애인에게는 폐쇄병동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교도소 수감이 에세이를 펴낼 만큼 값어치 있는 황금의 경험이었듯이.
폐쇄병동은 감옥이다. 병동이 환자의 신체를 가두기 때문에 감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폐쇄병동은 영혼을 가둔다. 환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결박해 병동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때로 약을 잘 먹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입을 벌려보라고 한다.
감옥은 ‘완전하고 준엄한 태도’이다. 감옥은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기구여야 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하자면 신체 훈련, 노동 능력, 일상 행동, 도덕적 태도, 적응력 등 개인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 즉, 완전 규율의 체제이다. 사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교육의 힘은 대단한 것이다. “감옥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을 크게 넘어선다.”
그리고 나는 말한다. “폐쇄병동은 단순한 자유의 박탈 그 이상이다.” 주기적으로 환자의 ‘모범적인’ 태도를 시험하고, 자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금서 대신에 정해준 아름다운 도서들을 읽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도록 짜인 프로그램을 듣고, 병원에 잘 적응하면 ‘형기’를 앞당겨준다.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다. 폐쇄병동 입원, 특히나 강제입원이란 명백히 21세기의 수치이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처한 상황이 폐쇄병동 속에서만 일어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은 환자복을 입고 ‘누가 보아도 환자’라는 딱지를 갖게 된다. 그러나 바깥세상으로 나오면 어떠한가? 어느 누구도 거리를 활보하는 개중 누가 정신병자인지 맞추고 호언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 비가시화의 전략을 띈다.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 차별을 덜 받는다. 혐오의 목소리에서 조금쯤 자유롭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자유’인가?
3. '정상인' 반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기본권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나는 적어도 한 번 우리가 출생 시에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존재라면, 사람대접을 받아야 그 논리에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서 감옥과도 같은 폐쇄병동에 있는 환자들을 모두 사회로 몰아내라. 그리하여 정신장애인이라는 사회의 ‘가시화 되지 못한’ 존재들의 부담을 모든 국민에게로 분산시켜라.
탈원화에 대해 생각한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서 벗어나는 것, “de"institutionalization탈원화다. 물론, 폐쇄병동에 갇힌 수많은 죄 없는 수감자들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란 이 정상 규범 제도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세상은 어찌보면 기분으로 치면 조금 널널한 병동과 같은 느낌일지도 모른다. 숨기면 가끔 장애인인 걸 모르는 체 해주고, 드러내면 아주 가끔씩은 동정이라도 해주는. 그러나 잘 ‘관리’되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서 모음집에 꽂히는 인생으로 마감하기엔 정신장애인 우리의 삶이 너무나 찬란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자해 흉터를 드러내어도, 나의 우울이 ‘여성적 우울’이 아니어도, 내가 설사 모든 성과 계급의 이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할지라도, 폐쇄병동에 입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서고 사회에서 성장하는 삶을 원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탈원화의 과제는 앞으로 ‘정상인’을 넘어서는 추후의 과제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아니,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 절대로 이르지 않고 적절한 시기, 바로 이 시대의 과제일지도 모른다. “탈원화는 탈시설을 넘어 정상성 제도를 이겨야 한다.”
참고문헌
김현경 저.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미셸 푸코 저.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 1994.
- 이전글각자의 세계, 그리고 모두의 세계. 19.03.22
- 다음글우리들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19.03.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