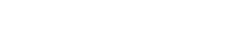나의 파견일지 10
페이지 정보

본문
나의 파견일지 10
-부표처럼 떠다니는 7월의 시간.
주말의 교육도 7월의 마지막과 함께한다. 더위는 익숙해지려야 익숙해지지 않고, 몸은 생각만큼 회복되어 지지 않는다.
별다른 일 없이도 체력은 떨어지고, 일상은 늘어진다. 글을 쓰려했던 계획도 어그러지고, 청소와 설거지는 밀리기 일쑤다.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잠을 자고 싶고, 하지만 그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한다. 쉽사리 잠들지 못한다. 그나마도 잠든 시간의 질은 좋지 못하다.
거기에 더위를 잡기 위한 에어컨 바람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에어컨을 켠 실내의 공기가 텁텁하기도 하고.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한 전기세가 압박이되어 나를 괴롭힌다.
경제적으로 회복되려면 언제가 되어야할까.
일을하지만, 돈이라는 압박은 나를 위축되게하고 숨어버리고 싶게한다.
분명 160언저리 정도의 수입으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왜 그것이 부족하기만 할까.
달에 120만 정도는 그냥 사라지는 고정 지출비가 있어서 일 것이다. 월 급여가 더 많았다면 분명 좀 괜찮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저 감사해야만 한다.
홀로 살아가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음에.
이러한 상황에 가정을 꾸리거나 연애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는 해도, 그건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일까.
할 수 있다고해도, 그건 행복해 질 수 있는 길일까.
바람직하고 옳은 일일까.
그러나 나는 연애를 시작했고, 연인과 함께할 날들을 꿈꾸고 있다. 연애를 시작하고 한달도 되지않아 가정을 논하는 것은 이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그녀와 나는, 그러한 생각을 지우지 않는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안정이 되는데, 좀 더 나은 내가 되기를 꿈꾸게 되는데, 어떻게 그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리고 그녀는 안다.
아직 급하게 논할 필요가 없으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음을 안다.
경제적 소득이 불안전하며, 근무환경이 지속적이지 못하다. 거기에 전세임대로 구한 원룸은 둘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비좁다.
이런 상황에 가정도, 더 나아가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차차 경제적 사정은 좀 나아지고 안정을 되찾을 테지만, 여유를 되찾는 것은 좀 더 먼,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다.
기약 없는 경제적 빈곤은 그녀와 나를 지치게 하지 않을까.
불안하고 초조하며 나를 구석으로 내몰아 간다.
물론 그녀 또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지만, 나의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좀처럼 사라지지않고 스틀스로 돌아와 불안을 가중시킨다.
다육이들의 저물어 가는 하엽을 떼는 그 순간들도, 물을 주고 잎에 물을 털어주는 그 순간들도, 일에 집중하기 어렵고 다육이들의 시선으로 느긋하고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보기도 어렵다. 그래도 그들을 보다보면 이대로도 괜찮지 않은 가 생각이 들고는 한다.
다육이가 내뿜는 싱그러운 향과 빛은 그런 활기가 있다. 온갖것에 짓눌리는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나는 홀로가 아니다. 다육이들이 홀로가 아니듯, 누군가의 손길과 다른 모든 것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듯, 내겐 동료가 있고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줄 연인이 있다.
불안과 초조도 있지만, 쓰러지지말라고 버텨주는 든든한 손들을 믿고 신뢰하자.
따스한 햇살에 안겨있는 다육이들처럼, 그 포근함을 믿자.
그리 생각하니 조금 힘이 난다. 내게 과분한 믿음과 사랑을 주는 동료들과 연인. 그리고 무수히 많은 내 인생의 조력들에 감사하자.
불안함에 위태로울 필요는 없다. 과거는 변할 수 없고 내 상황은 그저 그 상태로 ‘존재’할 뿐이다.
거기에 감저을 싣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헛되다. 그건 그저 나열된 정보이며 상태일뿐.
감정과 의미는 내가 가져다 붙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태껏 그래왔듯, ‘그저 그런가 보다’하며 내가 할 일을 찾고 묵묵히 하루 하루를 보내면 된다.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 그만이다.
하엽을 떼는 손길이 안정을 되찾아간다. 여전히 익혀야하고 외울 것 많은 화원에 일이다.
이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한다.
먼 미래를, 지쳐나갈 아득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길 상황이 아니다. 뉴딜 사업으로 파견 나온 화원의 일은 내 마지막 보루다.
여기서마저 있을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나는 또 다시 무직자로 정처없이 구직활동에 몸을 맡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제대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아마 어림도 없겠지.
경제적 빈곤은 나를 더욱 옥죄어 올거고, 식비조차 내게는 부담스러워 지겠지.
곤란한 생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도 운이 좋아야 가능할 거고, 나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추락할 테다.
일어설 기력을 잃고 혼자 방안에 틀어박힌 삶.
모든 인연을 잘라내고 세상에서 숨어버리지 않을까. 그리고는 쓸쓸하게 홀로 살아갈 거다.
기약없이 무기력한 나무늘보가, 아니면 괴물이 되어있겠지.
방향없는 불안과 분노에 좀 먹혀 현실을 등진다면, 조금은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조금 흔들린다.
아니, 그건 싫다.
도망치기도 싫고 홀로인것도 싫다. 나는 나무늘보가 되지도 괴물이 되지도 않을 거다.
다육이의 평안한 세상에 살고 싶었지, 식물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본능대로 사는 짐승이 되고팠던 것도 아니다.
융용 되어 형체를 잃고 녹아내리지 않도록, 나는 억지로 틀안에 나를 우겨넣는다.
나라는 틀을 만들어 반 쯤 녹아내린 나이 모습을 유지한다. 이대로 굳어 단단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화분에 진득하게 뿌리를 내린 다육이처럼, 나도 튼튼해지고 싶다. 흔들리고 지치고 싶지않다.
느릿한 화원의 시간 속에, 그 더움에 몸이 누더기가 되던 시간 속에, 나는 그 다짐을 꾹꾹 삼켜 넘긴다. 심장에, 뇌리 깊숙이에 새겨넣는다.
나를 지탱해주었고, 지탱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화원 속 다육이들처럼 꽂꽂이 자라나기를 바라며, 7월의 마지막들을 흘려보낸다.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되었다’며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나를, 지평선이 아득히 펼처진 망망대해의 부표에 묶어둔 체, 흘름에 몸을 맡긴다.
나는 어디로 흘러갈까.
나는 어디로 나아갈까.
- 이전글나의 파견일지 11 23.11.29
- 다음글전문가를 흉내내는 동료지원가들에게. 23.1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