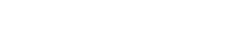나의 파견일지 (6)-안개 너머에.
페이지 정보

본문
나의 파견일지 (6)
-안개 너머에.
3주차 월요일의 시작은 또 파도손에 앉아있다. 민폐를 끼치는 것처럼 눈치가 보인다. 그럼에도 글을 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확보해서 마냥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파견일지를 작성하고 시간이 남으면 개인적으로 출판을 바라는 소설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글 하나를 완성하고 두 번째 파견일지를 작성할 때 파도손에 아무 일 않고 혼자 있다는 부채감이 덜어진다.
이리저리 움직이며 내가 뭔가 IT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기분이 좋기도 하고.
적어도 포맷이 다 끝내기 전까지는 그럴 것이다.
모두 마무리하고 느끼는 후련함과 상쾌함이 나를 뿌듯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걸 하는 동안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 좋았다.
물론 그 와중 틈틈이 또 다른 파견일지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대로면 파도손에 좀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인다.
글을 여유롭게 쓸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조금은 불안이 남아있지만, 괜찮을 것이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우리 당사자들에게 파도손은 평안한 고향 같은 곳이니까.
하지만 그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 뿐, 좋을 건 없는 일이다.
뉴딜 일자리에서 이탈자 수와 취업으로 연계된 수가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대로 이탈이 지속하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사업을 좌절시키는 훌륭한 이유가 되어 줄 것이다.
이번 대 정부나 서울 시는 파도손의 사업과 그를 포함하는 복지사업에 소극적이고 깐깐한 모습을 보이니까.
나는 하나이지만 파도손은 여럿이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올 새로운 당사자들도 있다.
그들 모두에게 직업을 빼앗는 짓을 나는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파도손이 주는 일자리들이 지속하는 것을 돕지는 못해도 막지는 말자.
파견 처가 정해져야 폐를 덜 끼치겠지만, 오후까지 별다른 말이 없으시니 내일도 파도손에 출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국장님 말대로 원칙대로면 나는 파견지 이탈이라 그대로 종료 되어야만 한다. 파도손에 계속 출근하면 그렇게 되는 걸까.
이대로 계약종료가 이뤄질까.
어디서 일하지?
일할 수는 있을까.
장애인 일자리는 번번이 떨어졌고, 학력도 제대로된 커리어도 없다. 그리고 일반직장에선 몸 상태나 정신상태나 스트레스를 제대로 다루는 것도 할 수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육체노동, 단순 생산직과 건설현장 노무직 정도 일 것이다.
내가 그 노동강도를 견딜 수 있을까?
아마 불가능하겠지.
이전에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힘과 체력이 부족하고 빈혈기도 있으며 관절도 삐거덕거린다. 거기에 고지혈증 직전의 상태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감기나 위 관련 질병도 자주 걸린다.
내 몸은 어디 하나 이전과 같은 구석이 없다.
난 비당사자 사이에서 일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자 시커먼 아가리를 벌린 끝 모를 절벽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두렵고 막막하며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나길 뿐.
포맷과 기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노트북을 보며 괜찮다 나를 달랜다. 동료의 위로도 마음을 안정시킨다.
그분은 보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지만 내 파견일지들을 읽고 해준 말이라 더 마음에 와닿는다.
글을 보니 내가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마음만으로 따스하다.
현실의 불안은 여전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들이 나를 쓰러지지않게 지지해주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불안이 조금가시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된다.
이게 며칠이고 지속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도 짧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일과가 끝날 무렵.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채시기라도 한 듯 파견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무국장님이 찾아오셨다.
화원에서 근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출퇴근시간이 길어 다른 곳은 안되는지, 모른 척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 순 없는 지 물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고, 나에게는 선택의 기회는 없다.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두 번이나 이탈할 때는 내 파견은 끝이 난다는 경고를 들었다. 사업의 탈락자가 된다고.
마치 등 뒤에 강물을 두고 싸우기라도 한 것처럼 위기감이 턱밑까지 차오른다. 더운 것과 거리가 멀다는 단점이 내게는 크게 다가온다.
‘출 퇴근에 지각하지 않을까?’
‘덥지않을까?’
‘여유시간은?’
이런저런 불안한 것들이 떠오르지만 별 수가 없다. 자업자득이다. 갈 곳은 더 이상없다. 슬며시 떠오르는 불만과 불안을 내리누르며 이런저런 걱정을 말씀하시는 국장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제대로해내자. 제대로 버티어내자.
두려움과 걱정을 삼키며 하루의 끝에선다.
잘 적응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지.
나는 그래야만 하니까.
- 이전글나의 파견일지 (7)- 새로운 파견지에서. 23.07.28
- 다음글나의 파견일지(5)- 안개 속에서. 23.07.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