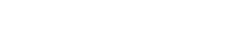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기고] 정신장애라는 신호
페이지 정보

본문
정신장애는 결함이 아니다
나는 열 살에 무지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가짜였다. 당시 나는 가정폭력 속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어느 날 가족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꺽꺽 울었다. 울음을 멎고 잠시 눈을 뜨니 눈앞에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 그것이 생애 처음 보는 환시였다.
열 살에 보았던 무지개는 다시 내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시 내 삶이 힘겨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위협하는 목소리와 소음, 검은 물체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환각은 반드시 내 삶에 다가올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을 때만 내게 다가왔다. 물론 그것은 사회적으로 질병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었다.
“정신장애는 나쁘지만 정신장애인은 나쁘지 않다”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른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신장애인이다. 오히려 이런 말은 정신장애인은 장애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는 인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장애가 핸디캡이어서는 안 된다. 환각을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쁘지 않다. 이것은 환각을 보는 당사자가 그것을 없애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과는 다르다. 외부에서 억지로 환각을 제거하려 드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는 것이다. 장애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서 능력을 박탈당하게 된 것을 의미할 뿐, 어떤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 것이 아니다.
정신장애가 발생하는 데는 맥락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정신장애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다. 통각이 그러하듯이, 정신장애란 나에게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위험에 놓여있는지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였다. 환시를 보는 것, 환청을 듣는 것, 신경질이 나고 예민해지는 것, 극도로 우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아픈 것.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에 겪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물론 그 자체로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마치 너무 작은 침대에서 웅크리고 자야 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게 가장 큰 형벌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에게 속삭이는 부정적 메시지다. 가장 해로운 것은 정신장애인의 모든 고통과 호소를 질환으로 치부하고, 개인의 심리 상태 결함으로 ‘퉁’쳐버리는 태도다.
누가 방아쇠를 당겼나
나는 학대,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여러 차례 다른 진단명을 받았는데, 가장 마지막 의사는 조현정동장애라고 했다. 폭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조현정동장애에 걸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 장애가 그러한 경험 없이 '그냥'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 명백히 그럴만한 맥락이 존재했고 질환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문화적 맥락 등이 어우러져 결정되는 복합적 산물이다. 정신장애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정신장애는 아무런 맥락 없이 그의 삶에 던 져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 속에 녹아든 것이 바로 정신장애다. 이를 단순히 '뇌 질환'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에 불과하다. 신경증, 정신증 같은 일련의 증상은 명백히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발현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 일어난다. 정신장애는 한 사람의 삶과 억지로 분리해낼 수 없는 일부분이다.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타인을 쓰러뜨렸다. 쓰러진 사람이 정신질환에 걸렸다. 사람들은 총알에 맞은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그의 정신 상태만을 비난하기 시작한다.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의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쓰러진 사람의 정신 상태를 낫게 하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렇게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는 피해자들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피해자’들이 정신과에 가서 받는 치료는 100% 약물 치료다. 한국 정신과에서는 약물 치료 외의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실제로 정신질환 급성기에 약물은 극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오로지 약물을 복용한다고 해서 정신질환이 낫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용량의 항정신증제를 매일 밤낮으로 먹고 있다. 약물이 내 감정 상태를 완화하고 진정시킨 것은 사실이나, 내게 찾아온 것은 손 떨림, 좌불안석,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이었고 재발도 수시로 일어났다. 약을 그토록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다시 급성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진실을 그 어떤 의사도 말해주지 않았다.
내가 바랐던 것은 매일 독한 알약을 스무 정씩 삼키며 부작용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의 폭력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었다. 가해자를 응징하며,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온정을 받아 살아남는 것. 그런 현실적 해결책이었다. 인간이라면, 끔찍한 폭력을 겪은 피해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는 약물을 복용한다는 사실로 도피해야만 했다.
개인의 심리 상태만을 문제삼는 방식, 그리하여 오로지 약물 치료를 맹신하게끔 하는 방식은 명백히 잘못됐다. 가정폭력을 사사로운 문제로 취급해,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하고 구제책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것과 매한가지다. 온갖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영역에 구겨넣고 공공에는 의료 권력만을 남겨놓는 행태, 이것을 온당한 치료라고 볼 수 있는가?
누가 방아쇠를 당겼는가? 정말로 정신장애인을 ‘치료’하려면 사태를 먼저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응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폭력, 가정폭력, 산업재해 등으로 많은 이들이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한다. 당연히 강제투약을 한다고 갑자기 이들이 멀쩡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이들에게 공명정대함을 보였을 때 비로소 아픔이 치유될 수 있다.
정신장애라는 신호
어쩌면 정신장애는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신호만이 아닐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 살기좋은 사회일수록, 이들의 장애와 그 원인이 묵과되지 않는 사회일수록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다. 그러면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한 사회 인권 지수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신호를 알리는 것이 정신장애인들이다. 정신장애인을 차별, 낙인, 배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삶 자체를 보장하며, 왜 그토록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었는지 성찰해야 한다.
관련링크
- 이전글[기고] 범죄자는 감옥에 가고 나쁜 환자는 어디든 간다 19.11.04
- 다음글[기고] 정신병원 안의 독방, 케어룸 19.1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