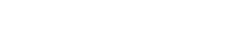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기고] 명절에 정신장애인 초대하기
페이지 정보

본문
명절의 정체
명절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해마다 가족이 한 곳에 모이는 기념일일 뿐일까. 해마다 명절이 되면 지옥 같은 고속도로 체증과 친척들의 오지랖 섞인 무례한 질문들을 겪는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큰집에 모이고, 제사를 지내며, 형식적인 것들을 한다. 수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노고를 누가 어떻게 감당하며, 돌아오는 길은 또 어찌나 지루한지. 대한민국에서 명절이 싫다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왜 우리가 무작정 이 날에 모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여태껏 모여왔는지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명절을 제대로 지내지 못한 적이 많았다. 다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아마 이 지면을 몽땅 할애해도 다 털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마디로 흔히 얘기하는 '정상가정'에 속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한 집에 살고, 명절 같은 날에는 친척들까지 함께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는,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가족' 말이다. 나는 그런 가정을 가지지 못했다. 이건 굳이 스스로 박탈감을 자초하는 일이 아니다. 남들과는 다르고, 그래서 남들처럼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히 섭섭하고 외로운 일이다.
명절이 되면 TV만 틀어도 가족 간의 끈끈함, 함께 만들어 먹어야 할 음식 따위를 떠드느라 바쁘다. 방송에서 연출하는 가족의 모습은 앞서 이야기한 '정상가족'의 모습이다. 내 친구는 학비와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명절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아는 언니는 집안끼리 사이가 좋지 않아 혼자 독서실에 간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명절에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사회가 기대하는 평균과 다른 ‘우리’는 왜 삭제돼야만 하는가.
명절이란 행사는 가족주의의 한 가지 상징이다. 큰맘 먹고 가족이 모이는 날짜를 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든 기차를 타고 친척을 만나러 갈 수 있고, 휴대전화로 통화도 할 수 있다. 명절을 지낸다고 더 돈독한 가족인 것이 아니라, 돈독한 ‘정상가족’으로 보이기 위해 명절을 지낸다. 멀쩡한 가족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의례인 셈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가족이 책임진다. 그리고 소위 ‘멀쩡한’ 가족이 아닐 경우, 그렇게 보이지 못할 경우의 페널티를 우리는 두려워한다.
흔히 ‘가족주의’라고 하면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뜻한 공동체의식 쯤으로 생각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말하는 가족주의는 대부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 비장애인 중심주의, 이성애 이데올로기 등 ‘정상성’의 모습을 그려놓고 그 외 형태의 존재를 차별한다. 이러한 가족주의는 가정을 지키지 않는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정신장애인 자녀와 동성애자 형제를 명절에 초대할 수 없게 하며, 아내와 딸에게만 집안일을 시킨다.
명절은 두 얼굴을 지녔다. 겉으로 드러난 명절의 가면은, 아름다운 가족 간의 화합이다. 그러나 가면을 벗겨내면 본색이 드러난다. 명절은 소위 ‘멀쩡한’ 가족만을 숭상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제한다. 명절은 ‘따돌림 문화’다. 이러한 ‘따돌림 문화’가 소외시키는 구체적인 대상에 정신장애인이 속한다.
정신장애인과 명절 지내기
올해 9월 13일에 추석이 있었다. 정신장애인들은 어떻게 추석을 보냈을까? 여느 비장애인들과 다르지 않게,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이다. 가족의 지지와 환대를 받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종일 불편하기만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명절에 가족을 만나지 않았거나 만날 가족이 없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의 삶은 각기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족의 지지와 환대를 받는’ 정신장애인은 이 혐오적인 사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가족 안에서 ‘눈칫밥’을 먹거나 환대받지 못하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은 '일반 시민'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같은 가족이라도 가정 내에서는 서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성별과 나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가족 구성원은 각기 다른 경험을 한다. 나는 친척들을 만날 때 정신장애인이었던 적이 없다. 올해도 어김없이 손아랫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캐물어댔을 우리 친척들은 얼마나 편협하고 두려운 존재인가.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더 이상 용돈을 주거나, 악수하고 싶지 않을지도 모른다.
정신장애인은 매일같이 몰래 정신과 약을 삼키며 주변에는 비밀로 해야 한다.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두려워 가면 속으로 꽁꽁 숨어있는 정신장애인들은 가족조차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위계질서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피라미드의 최하단에 정신장애인이 놓여 있다.
정신장애가 없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치부’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숨길 이유가 없고, 때문에 ‘밝힐’ 이유도 따로 없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는 필수적으로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인다. 정신장애를 밝히느냐, 감추느냐. 나는 인권 활동을 하면서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인간관계에 커밍아웃 했다. 커밍아웃은 벌벌 떨며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도 아니고, 굴욕적 아웃팅(원치 않는 커밍아웃)과도 다르다. 자발적으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내 주변 사람들과, 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의사다.
모든 이가 편견 어린 시선과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러나 용기 있는 당사자들이 주변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편견을 조장하는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등 점차 '은둔의 정치'를 탈피하고, 세상과 소통한다. 그런 노력의 결과일까? 특히 내 또래 친구들은 정신과에 다닌다는 사실을 예전보다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10년을 정신장애인으로 살아온 20대 당사자로서, 요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은 불식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명절에 가족들을 만난 정신장애인은 다시금 침묵하게 된다. 자신이 정신장애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피해를 입을까, 어쩌면 그 사실이 '정상적 가족'의 물을 흐리게 될까 두렵다. 명절 특집으로 나오는 TV 쇼의 가족 중에는 정신장애인이 없다. 우리 가족 내에도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이 가장 나를 도와주는 지지대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가정이란 공간은 가장 보수적이고 불평등하다. 정신장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가족은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없다.
그러나 존중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명절은 아주 기쁜 축제와 같은 날이다. 유독 한국 사람들만 명절을 피로해 한다. 왜일까. 앞서 이야기한 '정상가족' 개념으로, 성역할을 구분하고 사회적 약자인 가족 구성원을 차별해가며 정상적인 가족의 겉면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 탓에 수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명절의 피해자가 됐다. 그런 명절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로 '명절'을 잘 지내고 싶다면, 정말로 '가족을 위한' 명절을 지내려 한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정신장애인 가족과 명절을 함께 보내야 한다. 정신장애인 가족이 자신을 감추지 않고도 명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의 정신장애인 가족을 환대하라. 그리하면 더욱 뜻깊고 아름다운 명절이 될 것이다.
관련링크
- 이전글[기고] 정신병원 안의 독방, 케어룸 19.11.04
- 다음글환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19.07.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