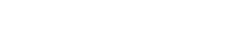우리는 약 잘 먹는 아이가 아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는 약 잘 먹는 아이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주체가 아니다. 주체의 소유물이다. 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려고 보건 현장에 뛰어들면, 언론은 보통 그러한 이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원해주었는가에 대해 부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동일한 인격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에게 장애인은 통제권 하에 '말을 잘 들어야 하는' 타자, '어린 아이'이다. 그래서 종종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나 존경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이들조차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름을 불린다든지 아이처럼 대우 받곤 하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에 있어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현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항상 '가족들의 수고로움'과 '가족들 삶의 황폐화'가 필수적인 것처럼 언급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의 소유물, '짐덩이'인 정신장애인 당사자에게 항상 "약을 잘 챙겨먹고, 의사 말을 잘 따라야 해." 라며 '관리'하려 든다. 순전히 아이 취급이다. 세상 어떤 사람이 당뇨병 환자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는다면서 환자 자체의 판단력을 무시하려드는가? 세상 어떤 간호사가 당뇨병 환자에게 아이를 대하듯 격식없이 '약을 먹으라'고 윽박지를 수 있는가?
흔히 한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느냐는 것은 '약물 치료'를 받고 있냐는 의미다. 정신과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특히 급성기 환자의 경우, 때로 우리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흔하게, 우리는 비만, 고지혈증, 칼슘을 손실하는 등의 끔찍한 합병증에 시달리게 된다. 의료계는 그러한 합병증에 대하여 침묵한다.
미국의 경우 정신과 의사들이 약물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법원으로 갈 수도 있다. 투약을 거부할 권리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약을 먹지 않는 환자에 대해 곧잘 '강제입원'을 논하곤 한다. "위험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위험한가? 투약을 거부하는 환자는 곧 '관리'되지 못하여 폭력성을 나타내는 환자라는 가상의 존재를 상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 얼마나 실존하는지, 정말 투약의 거부와 정신증의 발현이 '폭력적' 행태를 만드는지 그런 것들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환자'는 손쉽게 '범죄자'가 된다.
최소한의 약물과 개인 심리치료 등으로 구성된 '통합 치료'가 약물만의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미국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항정신증 약물은 환각과 망상을 진정시키기는 해도, 견디기 힘든 부작용을 유발하여 대부분 환자들이 약을 끊으려 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정부 조현병 치료의 새 가이드라인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통합치료는 유럽에서는 이미 보급되어 있는 방식이다. 왜 한국의 정신의료계는 이러한 '통합치료'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는가? 약물을 투여해서 생긴 수많은 삶의 부작용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가?
정신장애인은 사람인가? 단순히 우리가 인간의 장기를 달고 태어났느냐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느냐는 의미에서 묻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하듯 정신장애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지고 대우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정신장애인이 생각할 줄 모르고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약물을 잘 먹어야 한다'며 관리하려 들고 언제나 '착한 아이'로 호명하려 한다.
정신장애인을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약 잘 먹는 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생각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장애인, 정신장애인일 뿐이다.
- 이전글병은 범죄자를 만들지 않는다. 19.07.01
- 다음글범죄자는 감옥에 가고, 나쁜 환자는 어디든 간다. 19.06.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